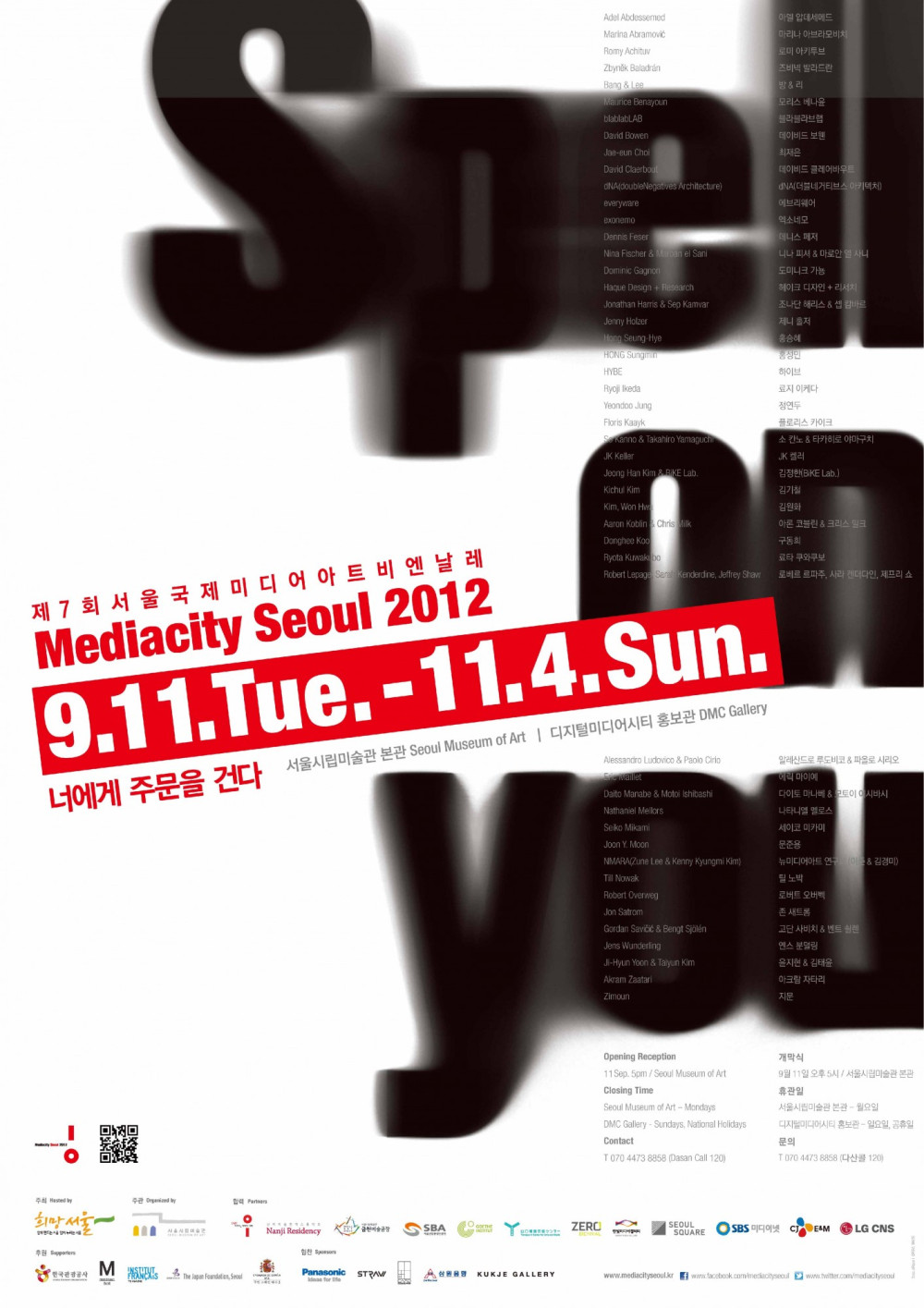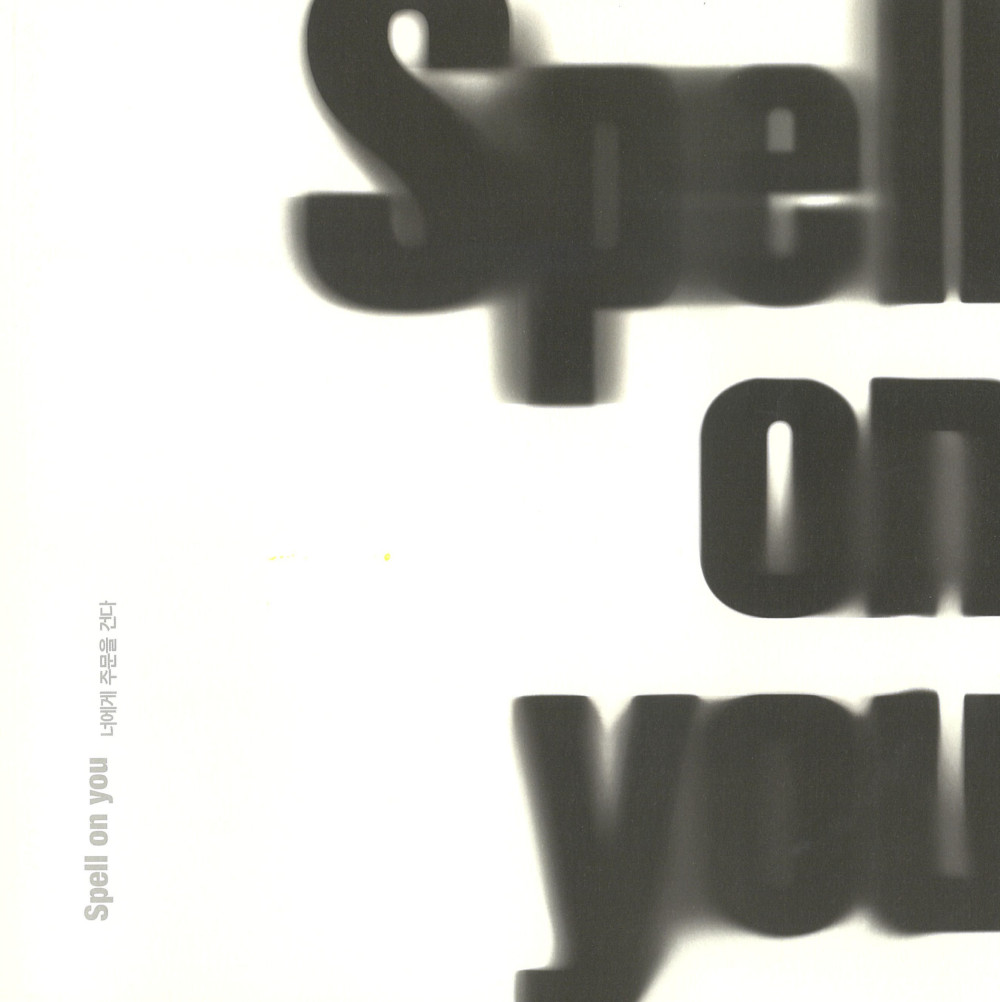〈크라프의 마지막 테이프〉는 부조리한 희곡의 부조리한 제목이다. 상상해보라. 거의 시각장애인에 잘 듣지도 못하는 쇠약한 노인이 반쯤 술에 취한 채 너저분한 방에 홀로 쭈그리고 앉아서 바나나로 끼니를 때우며 자신의 목소리가 녹음된 옛날 테이프들을 틀고 있는 모습을. 그것도 녹음의 상당 부분이 그 이전의 테이프들에 대해 언급하는 테이프를. 〈로버트해치〉 사뮤엘 베케트의 단막극 〈크라프의 마지막 테이프〉의 비디오 퍼포먼스를 한 줄기의 꿀로 ‘코드전환’을 한 이 설치작업에서 약 3미터 높이에서 흘러내리는 ‘꿀줄기’는 연극의 내러티브에 반응하며 지진계가 진동하듯 흔들린다. 그리고 바닥에 있는 꿀 웅덩이의 표면에 덧없는 흔적을 남긴다. 이 작품은 퍼포먼스의 모든 순간과 그에 동반하는 소리뿐만 아니라 밀도 있게 채워진 침묵과 멈춤에도 촉각이 가능한 형태를 부여한다. 이 물리적인 인코딩은 베케트가 현존을 통해서 ‘말하는’ 것만큼이나 부재를 통해 ‘말하는’ 방식 역시 강조함으로써 연극의 구조적 역동성을 부각한다. 꿀이 흘러내려 투명한 통 안에서 서서히 뒤섞이는 과정에서 꿀을 담는 용기는 ‘데이터 옮겨 적기’를 하듯 침전물의 층을 축적하면서 퍼포먼스를 구체화하게 된다. 그러나 꿀은 작품의 ‘지질학적 데이터 지도’를 만들기보다는 용기 속에서 뒤섞이고 어우러지면서 분리 불가능한 덩어리라는 볼륨으로 재구성된다. 이 ‘해석된 데이터’는 꿀이 움직이지 않는 상태로 되돌아감에 따라 시각적인 동시에 상징적으로 그것의 물리적인 운반자인 꿀로 다시 환원된다. 그리고 모든 해석의 전략은 다시 열린 채로 남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