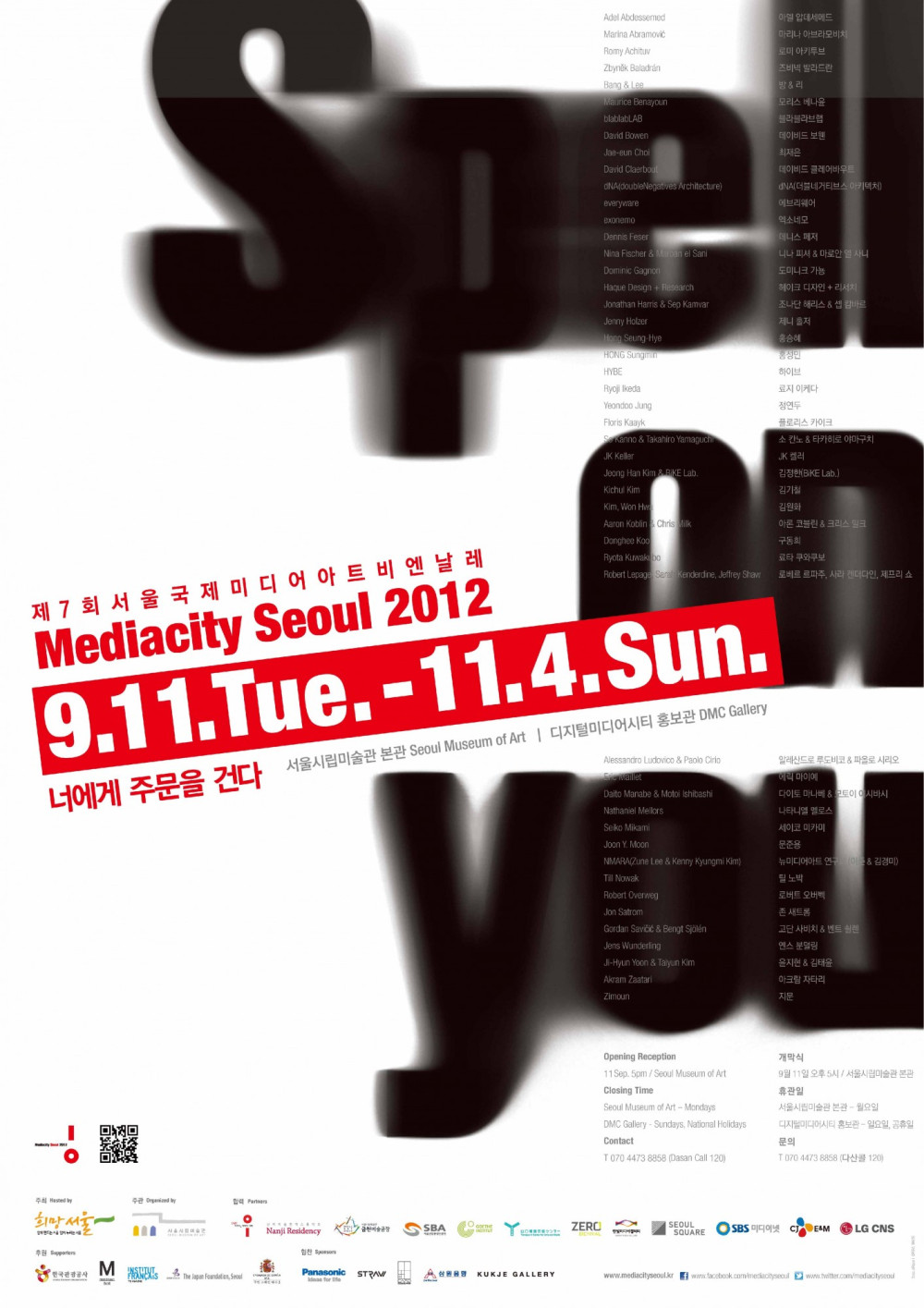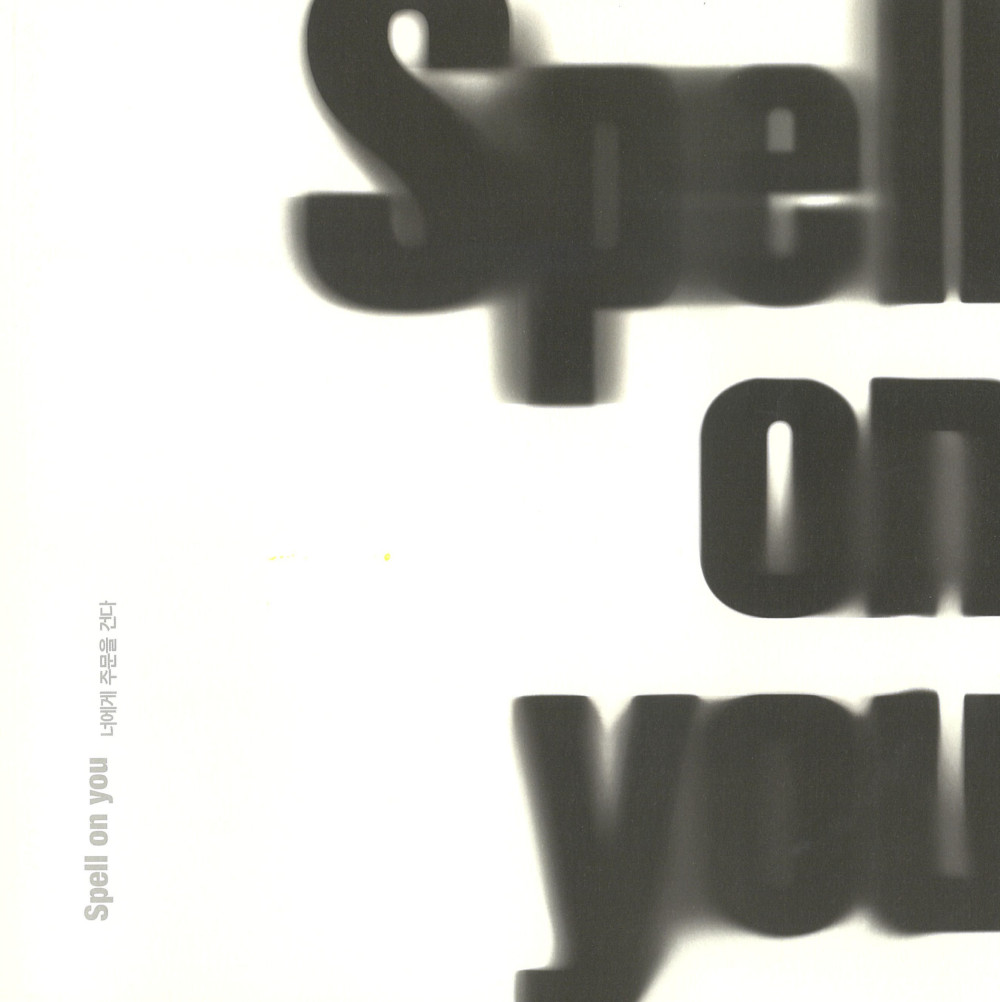전시회장 곳곳에 놓여 있는 장치로부터 이따금 사람의 목소리가 흘러 나온다. 마이크와 스피커를 갖춘 이 장치는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있어 건물 안에 있는 누군가의 중얼거림은 몇 초 늦게 다른 공간에 출력되고, 계속해서 다른 장치로 전송되어 출력된다.
정보의 입력 전송 출력은 건물 내의 온갖 곳에서 일어나고 있다. 관객 각각은 각 전시공간에서 그 일부를 체험한다. 이와 동시에 별도로 설치된 청취실에서 건물 안의 소리와 무선(無線)으로 연결된 상호작용 전체를 조감할 수 있다. 이 ‘작품’은 시스템 상으로는 네트워크화된 장치와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상호작용의 총체이며, 개념적으로는 각 전시에 대한 코멘트를 포착하여 네트워크화하는 메타적 층위이다.
전시물에 대한 개인적인 속삭임이 갑자기 다른 공간에서 들린다. 트위터의 속삭임이 리트위트(RT)에 의해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순간적으로 전달되어 버리는 이 작품에서(인간을 매개로 한 것은 아니지만) 정보는 네트워크를 통해 예상치 못한 곳에 전달됨으로써 새로운 의미와 해석을 파생시킨다. 건물 내부의 닫힌 회로는 세계에 대한 하나의 축도라고 할 수 있다. 게다가 전체 시스템은 일종의 ‘인터페이스’로서 전시 공간과 관람객 사이에 놓인 감각적 층위를 중재한다고 해석될 수 있다.
별 뜻 없는 개인적인 말들이 공간을 넘어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되는 것을 감시 시스템으로 여길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 시스템은 공간적 거리 및 사적인 것과 공적인 것의 경계를 넘어 건물 안이라는 유리상자 안에 있는 모두가 코멘트와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는 상향식 의사결정구조가 될 수도 있다. 지금까지 ‘미스커뮤니케이션’으로 간주되어 온 정보가 공간을 넘어 공유됨으로써 하나의 장을 이루기 시작한다. 이 작품은 소셜 미디어의 시대에 우리가 의사소통의 방식을 재창조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